
1930년대 서울의 명물은 백화점이었다. 전차와 자동차 등 문명의 이기가 진작 보급됐다. 하지만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상징인 백화점만큼 당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휘어잡지는 못했다.
유럽풍의 웅장한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등을 갖춘 백화점은 그 자체로 볼거리여서 수학여행코스로도 각광받았다.
부산근대역사관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25일까지 가진 ‘백화점, 근대의 별천지’ 특별기획전을 계기로 이제 팔순을 넘긴 우리나라 백화점의 탄생과 그 역사를 소개한다.
◇백화점, 근대의 별천지=최초의 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의 전신인 미쓰코시(三越)경성점이다. 1906년 포목점 형태로 진출했던 일본의 미쓰코시 오복점(吳服店)이 1930년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본점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대규모 신관을 만들면서 근대적 백화점의 첫발을 내딛었다.
조지야(丁子屋), 미나카이(三中井), 히라다(平田) 등 일본계 대형 상점들도 앞 다퉈 백화점을 설립했다. 이들 백화점이 들어선 식민지 시대 명동과 충무로 일대의 스카이라인은 조선인 상권인 허름한 종로와는 확연히 달랐다.
화려한 서양식 석조건물은 이국적 정취를 뿜어냈고, 대리석 바닥은 신을 벗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매끈했다. 각종 화장품, 찻잔 등 고급스런 상품은 유리 진열장에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고 예쁜 아가씨들은 손님을 왕처럼 모셨다.
최대 볼거리는 첨단 설비였던 엘리베이터였다. 당시 경성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으로 은행과 호텔이 있지만, 서민들이 스스럼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백화점뿐이었다.
이 때문에 재미로 타보기 위해 시골에서까지 올라오는 사람들로 엘리베이터는 늘 붐볐다. 요즘에는 없는, 당시 백화점만의 자랑거리는 옥상 정원이다.
일본 백화점에서 유래된 이 옥상 정원은 정원과 분수대, 찻집, 그리고 전망대까지 갖추어 사교의 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백화점은 문화공간 노릇도 했다. 미쓰코시, 화신, 조지야 등은 건물 상층부에 홀을 보유해 이곳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음악회 강연회 등을 열었다. 갤러리를 갖추어 각종 전시회도 가졌다.
당시 경성 인구의 3분의 1이 일본인이었다. 따라서 이들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일본인 고객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지만 조선인 상류층도 이곳에서 쇼핑을 즐기며 부르주아의 삶을 즐겼다.
하지만 대다수 조선인은 공장 노동자, 룸펜 등 도시 빈민으로 사는 게 현실이었다. 그래선지 백화점은 끊임없는 절도에 시달렸다. ‘굶는 자식을 차마 못보고 출옥 4일 만에 또 도적질, 백화점에 나타난 짠발잔’, ‘사치의 파도 넘치는 도시에 왔다가-미모의 인테리 여성, 백화점에서 절도’ 등의 절도 뉴스가 자주 언론에 소개됐다.
◇토종 화신백화점, 일본계에 도전장=당시 서울은 청계천을 경계로 충무로 명동 을지로 등 일본인 상권인 남촌과 조선인 상권인 북촌의 풍광이 확연히 달랐다.
충무로 등은 세련된 복장을 한 일인들로 흥청거렸지만 종로는 과거 시전거리의 영광이 무색할 정도로 낮에는 한산했다. 더욱이 1930년대 일본계 백화점이 남촌에 대거 들어서면서 종로 상권은 크게 위축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상권에 조선의 파워를 보여준 주인공이 1932년 종로에 화신백화점을 세운 박흥식이다. 박흥식은 이웃한 동아백화점까지 인수해 덩치를 키웠다.
하지만 당시는 화신백화점도 초라한 2층 벽돌집이었다. 그랬던 화신백화점은 1935년 대화재를 계기로 건물을 신축했다.
순차적인 공사 끝에 1937년 최종 자태를 드러낸 지하 1층, 지상 6층 신고전주의 양식의 화신 백화점 신관의 위용은 대단했다.
박흥식은 업계 후발 주자이면서도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쳐 1930년대 후반에는 영업세 납부액이 일본계 백화점과 대등한 수준이 됐다.
박흥식의 전략 중 하나가 민족백화점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이다. 신문 광고에는 ‘도약하는 조선의 화신’ ‘조선의 백화점’ 등의 표현을 써 민족성을 한껏 강조했다. 화신백화점 갤러리에선 조선 화가들의 전시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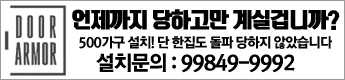 |
||
 檢 “원세훈, 댓글 민간요원 동원·관리 직접 지시”
檢 “원세훈, 댓글 민간요원 동원·관리 직접 지시”
 아일렛 vs 플라워, 도심 속 가든파티 스타일링
아일렛 vs 플라워, 도심 속 가든파티 스타일링